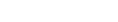"그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비닐막에 불과했죠." - 대기 중 심장을 이식받은 59세 고영희 씨
비닐막에 불과했죠." - 대기 중 심장을 이식받은 59세 고영희 씨

“심부전증이 가족력이에요. 아버지가 47세에, 오빠가 38세에 심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젊어서부터 심부전 증상이 있었지만 일을 계속했어요. 2018년 2월까지, 심장 기능이 25% 남았을 때까지요. 통역안내사로 일했죠.”
“그런데 이 병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서서히 점점 나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병이랄까. 심장의 마지막 정거장, 심장의 암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숨이 차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2018년 3월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숨이 차서 높은 곳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식 신청을 했죠. 그때 심장 기능은 10~15% 정도 남은 상태. 심장은 일단 이식 대기에 들어가면 보통 6개월 이상을 못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드물게 길어야 1년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잊을 수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심부전 환자들은 보통 일반병실에 머물면서 장치를 달고 도파민 약물을 계속 주입받거든요.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게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맞으며 병원에 대기 상태로 한 달이 되면 2순위가 되고, 또 시간이 가면 1순위로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꼼짝도 못 하고. 퇴원하는 순간 다시 쌓아온 순위가 물거품이 되니까.”
“만약 대기 중에 몸이 못 버티면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요. 저도 입원 중에 호흡곤란이 두 번 정도 와서 비상벨 누르고 간호사 쫓아오고···. 중환자실에 가면 인공호흡기를 다는데 그 고통을 맨 정신으로 버틸 수 없으니 마취를 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켜보다 심장이 안돌아오면, 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기다리던 분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중환자실에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올라오면,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옆에 있던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걸 보는 심정이란···. 거기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비닐막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든 때가 오면 그 너머로 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죠.”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죽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7, 8월이 되잖아요? 장마가 지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때 뇌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누가 옆에서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는 그 딜레마가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번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대기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게 됐어요. 의식 돌아오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 ‘누가 주셨을까’. 그분의 목숨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귀한 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하며 울면서 다짐했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 저랑 제 딸도 저의 장기 이식을 대기하던 중에 장기 기증 동의를 했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런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주저 없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서서히 점점 나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병이랄까. 심장의 마지막 정거장, 심장의 암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숨이 차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2018년 3월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숨이 차서 높은 곳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식 신청을 했죠. 그때 심장 기능은 10~15% 정도 남은 상태. 심장은 일단 이식 대기에 들어가면 보통 6개월 이상을 못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드물게 길어야 1년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잊을 수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심부전 환자들은 보통 일반병실에 머물면서 장치를 달고 도파민 약물을 계속 주입받거든요.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게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맞으며 병원에 대기 상태로 한 달이 되면 2순위가 되고, 또 시간이 가면 1순위로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꼼짝도 못 하고. 퇴원하는 순간 다시 쌓아온 순위가 물거품이 되니까.”
“만약 대기 중에 몸이 못 버티면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요. 저도 입원 중에 호흡곤란이 두 번 정도 와서 비상벨 누르고 간호사 쫓아오고···. 중환자실에 가면 인공호흡기를 다는데 그 고통을 맨 정신으로 버틸 수 없으니 마취를 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켜보다 심장이 안돌아오면, 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기다리던 분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중환자실에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올라오면,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옆에 있던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걸 보는 심정이란···. 거기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비닐막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든 때가 오면 그 너머로 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죠.”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죽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7, 8월이 되잖아요? 장마가 지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때 뇌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누가 옆에서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는 그 딜레마가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번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대기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게 됐어요. 의식 돌아오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 ‘누가 주셨을까’. 그분의 목숨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귀한 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하며 울면서 다짐했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 저랑 제 딸도 저의 장기 이식을 대기하던 중에 장기 기증 동의를 했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런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주저 없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 기사 취재김은지 곽도영 김동혁 이윤태 기자
- 사진 취재송은석 곽도영 김동혁 이윤태 기자
- 그래픽김충민 기자
- 프로젝트 기획이샘물 김성규 기자
- 사이트 제작디자인 이현정, 퍼블리싱 김수영, 개발 윤태영
- 총괄팀장임우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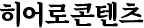 의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프로젝트 더보기
의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프로젝트 더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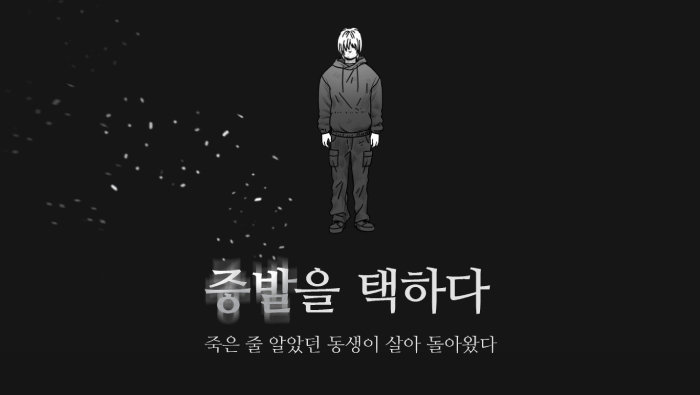 증발을 택하다
증발을 택하다‘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15.6.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그렇게 사라졌던 ‘증발자’ 문모 씨(48)가 어느 날 살아 돌아왔다.
더보기 -
 증발해 산다
증발해 산다저마다의 사연을 감당하지 못해 자발적 실종을 택한 사람들, 자신이 몸담던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해버린 사람들, 그러나 엄연히 속세에 존재하는 사람들. ‘증발자’ 4명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찾아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더보기 -
 어느 날 죄인이 됐다
어느 날 죄인이 됐다전북 진안에서 17년, 전주 우아동에서 20년. 매운탕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았다. 60대 후반의 김호섭 씨 부부가 젊은 날을 쏟아 부은 ‘죽도민물매운탕’.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 이름이 졸지에 ‘코로나 식당’이 되고 말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