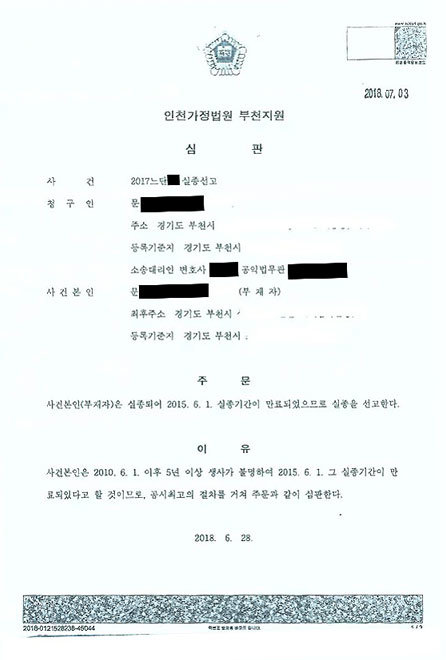바람 한 점 없이 무덥던 2013년 9월 어느 날.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찔한 고층 빌딩들 사이, 5층짜리 나지막한 상가 공사 현장이 그날 나의 일터였다. 전날 비가 내려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었지만 일이 하루 밀린 터라 마음이 급했다.
한순간이었다. 여느 때처럼 철근을 나르려 2m 높이 나무 발판에 올라서자 발판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 몸이 기우뚱하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오른손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다. 넘어지는 순간 옆에 있는 물건을 붙잡으려던 게 하필 날카로운 철근 단면을 잡은 것이다. 의사는 오른손 엄지의 인대가 끊어졌다고 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했지만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란 얘기에 멈칫했다.
나를 고용한 하청업체 현장 반장에게 사고를 알렸다. 그는 내 잘못이라며 수술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원청업체를 수소문해 부탁했지만 이미 하청업체에 안전비용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통사정을 한 끝에 간신히 하청업체에서 8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수술은 멀어졌다.
물컵 하나 들 수 없었다. 공사장에 못 나가니 점점 가난해졌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도 피했다. 술 한잔은커녕 끼니 챙길 돈도 없는데 누굴 만날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술을 사겠다며 나오라고 했다.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손을 벌리기도 싫었다.
가족과의 연락도 꺼려졌다.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 허울뿐인 가장. 한마디로 ‘루저’가 된 나를 가족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수치스러웠다. 아···.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개도 들 수 없었다. 없는 살림에 자식들을 알뜰살뜰 키워낸 나의 어머니. 노모에게 두 아이를 맡기러 온 못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밟혔다. 그럴수록 어머니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점점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롭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졌다.
혼자 반지하방에 머무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바닥에 널브러져 TV를 보며 소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TV 소리를 뚫고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떠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널 싫어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송곳으로 머리를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찾아온 그 목소리.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그 목소리가 다가왔다.
그 목소리를 피하려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빈손으로 방을 뛰쳐나와 고물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서울로 들어서 있었다. 처음 멈춘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를 멈추려면 저들과 이야기를 해야 해.’ 절박한 마음과 달리 몸은 머뭇거리기만 했다. 결국 누구에게도 다가서지 못했다. 나 같은 루저와 누가 어울리겠는가···.
그때부터였다. 증발자의 삶에 발을 디딘 것은.
‘배달존 2’. 나의 안식처였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전화로 음식을 시킨 뒤 배달원과 만나는 곳.
사람들이 버리고 간 망가진 텐트를 주워 공원 수영장 뒤편 우거진 수풀에 나의 집을 세웠다. 사람들이 먹다 남긴 치킨과 피자로 나의 상을 차렸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돌아다니다 해가 지면 여의도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다. 나의 집에서 고개를 내밀면 KB국민은행 간판이 보였다. 고개를 쳐들면 LG 로고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은행에 갈 일도, 휴대전화를 살 일도 없었다. 누군가는 요즘 한국에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락해야 할 사람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도 없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발자로 보낸 세월이 6년. 그 사이 많은 것을 잃었다. 영양실조와 각종 자전거 사고 때문에 이가 우수수 빠졌다. 몸은 점점 말라갔다. 스스로 선택했지만, 증발의 대가는 참으로 잔인했다.
힘들었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부끄럽고 미안해서. 언젠가 어머니와 아이들이 사는 집 근처에 간 적이 있었다. 애들 몰래 뒷모습이라도 보고 오려 했지만 그냥 금방 돌아왔다. 내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다.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고민한 적도 두 차례. 죽고 싶었지만, 죽기 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