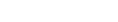"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던 제게
이렇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 대기 중 신장을 이식받은 64세 박병윤 씨
이렇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 대기 중 신장을 이식받은 64세 박병윤 씨

“40대 초반에 병을 알았어요. 몸 여기저기가 붓더라고요. 혈뇨도 나오고. 신장은 핏덩어리 사구체들로 이뤄지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사구체신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로 관리를 했지만 재생은 안 됐죠. 갈수록 나빠지기만 해서···.”
"2003년 12월부터 주 3회 투석을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투석 바늘이 볼펜심만 한데, 불순물을 뺄 때 영양분도 빠지니 얼굴은 시커메지고 어지럽고···.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소변 배출이 안 되니까 먹는 걸 전부 주사기로 빼는 셈인데. 물도 못 마시고, 국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고. 칼륨을 못 먹게 하니 바나나도 못 먹고. 한마디로 모든 게 안 되는 것 투성이였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투석하는 기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을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틀에 한 번 투석을 해야 하니. 어디 가지도 못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열리는 친척 결혼식 같은 것도 못 가고···. 아빠가 계속 아프니 아이들도 어딜 갈 수가 있나. 계속 집안 자체가 회색인 것이죠.”
“2004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 이식 대기 신청을 했는데 2011년 3월 11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큰 수술이라는데 무서움을 느낄 새도 없고, 오직 ‘이제 살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원 없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싶었거든요. 여름에 목마를 때, 입속에 조그만 얼음 하나 물고 참고, 천에 물을 적셔서 입에 물고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꼬박 7년이었어요.”
“누구신지 알 수 없지만 기증을 선택해주신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전 딸만 둘인데 외손자, 외손녀도 봤어요. 다 이름 모를 그분이 주신 선물이죠. 기증인을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오묘해요. 내가 다시 산 날이 어느 분의 돌아가신 날이고, 좋고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슬프고 그렇죠.”
“언젠가 기증인 가족과 이식인의 자조모임에 갔을 때예요. 기증자 유가족들이 초기에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뇌사는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고. 그런데 거기다 본인의 뜻을 묻지 않고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은 테이블에 저랑 기증자 유가족 네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만 우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던 제게 이렇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떠난 가족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세요’라고요. 많은 위로를 받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03년 12월부터 주 3회 투석을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투석 바늘이 볼펜심만 한데, 불순물을 뺄 때 영양분도 빠지니 얼굴은 시커메지고 어지럽고···.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소변 배출이 안 되니까 먹는 걸 전부 주사기로 빼는 셈인데. 물도 못 마시고, 국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고. 칼륨을 못 먹게 하니 바나나도 못 먹고. 한마디로 모든 게 안 되는 것 투성이였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투석하는 기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을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틀에 한 번 투석을 해야 하니. 어디 가지도 못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열리는 친척 결혼식 같은 것도 못 가고···. 아빠가 계속 아프니 아이들도 어딜 갈 수가 있나. 계속 집안 자체가 회색인 것이죠.”
“2004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 이식 대기 신청을 했는데 2011년 3월 11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큰 수술이라는데 무서움을 느낄 새도 없고, 오직 ‘이제 살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원 없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싶었거든요. 여름에 목마를 때, 입속에 조그만 얼음 하나 물고 참고, 천에 물을 적셔서 입에 물고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꼬박 7년이었어요.”
“누구신지 알 수 없지만 기증을 선택해주신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전 딸만 둘인데 외손자, 외손녀도 봤어요. 다 이름 모를 그분이 주신 선물이죠. 기증인을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오묘해요. 내가 다시 산 날이 어느 분의 돌아가신 날이고, 좋고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슬프고 그렇죠.”
“언젠가 기증인 가족과 이식인의 자조모임에 갔을 때예요. 기증자 유가족들이 초기에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뇌사는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고. 그런데 거기다 본인의 뜻을 묻지 않고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은 테이블에 저랑 기증자 유가족 네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만 우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던 제게 이렇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떠난 가족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세요’라고요. 많은 위로를 받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기사 취재김은지 곽도영 김동혁 이윤태 기자
- 사진 취재송은석 곽도영 김동혁 이윤태 기자
- 그래픽김충민 기자
- 프로젝트 기획이샘물 김성규 기자
- 사이트 제작디자인 이현정, 퍼블리싱 김수영, 개발 윤태영
- 총괄팀장임우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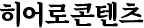 의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프로젝트 더보기
의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프로젝트 더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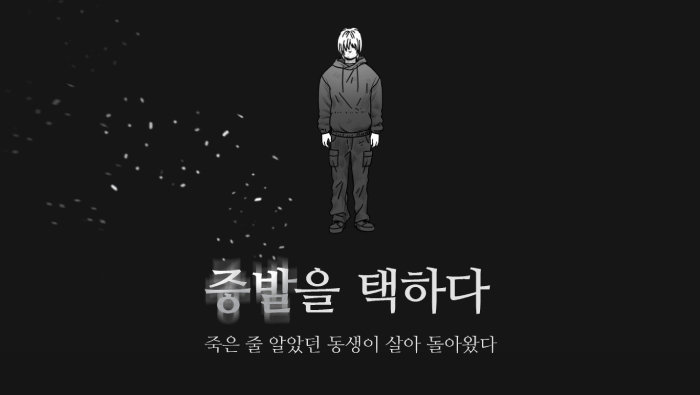 증발을 택하다
증발을 택하다‘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15.6.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그렇게 사라졌던 ‘증발자’ 문모 씨(48)가 어느 날 살아 돌아왔다.
더보기 -
 증발해 산다
증발해 산다저마다의 사연을 감당하지 못해 자발적 실종을 택한 사람들, 자신이 몸담던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해버린 사람들, 그러나 엄연히 속세에 존재하는 사람들. ‘증발자’ 4명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찾아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더보기 -
 어느 날 죄인이 됐다
어느 날 죄인이 됐다전북 진안에서 17년, 전주 우아동에서 20년. 매운탕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았다. 60대 후반의 김호섭 씨 부부가 젊은 날을 쏟아 부은 ‘죽도민물매운탕’.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 이름이 졸지에 ‘코로나 식당’이 되고 말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