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못한 이유
김태언 기자동아일보 사회부
2024-07-08 10:00:01
4시간의 인터뷰를 마치고 짐을 챙기던 참이었다. 한 손으로는 동대구역으로 가는 길을 검색하며, 조금은 가볍게 말을 이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질문은 짧았는데, 답은 길었다.
가끔 뜨개질한 물건들을 가지고 프리마켓에 나간다고. 수선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사람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그 기분을 가끔 떠올린다고. 며칠을 고민했는데 왜인지 기자님에게 말하고 나면 그때 그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지금보단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연락했다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 다섯 줄의 말을 생각했다.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아무한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1회의 주인공 강선주(48)와의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질문은 짧았는데, 답은 길었다.
가끔 뜨개질한 물건들을 가지고 프리마켓에 나간다고. 수선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사람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그 기분을 가끔 떠올린다고. 며칠을 고민했는데 왜인지 기자님에게 말하고 나면 그때 그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지금보단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연락했다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 다섯 줄의 말을 생각했다.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아무한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1회의 주인공 강선주(48)와의 첫 만남이었다.
 일하는 내내 불법사채업자들의 전화에 시달렸던 선주. 한 사람에게 4시간 만에 764통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일하는 내내 불법사채업자들의 전화에 시달렸던 선주. 한 사람에게 4시간 만에 764통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돌고 돌아 스토리텔링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에게 주어진 목표는 ‘킬러 팩트’를 발굴하는 것이었다. 이전 팀들이 스토리텔링을 우선순위에 뒀다면, 시즌2는 팩트 발굴에 더 힘써보자는 취지였다. 불법사채를 소재로 정하고, 초반에 주력한 건 사채왕 찾기였다. 불법사채를 다루면서 피해자 이야기를 꺼내는 게 뻔하다는 생각도 컸다. 하지만 사채왕을 쫓는 내내 팀 내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처음부터 이 소재를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결론은 피해자의 스토리텔링 기사는 빠질 수 없다는 것. 가해자 취재에 집중하더라도 우리 기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피해자였다. 다만 큰 걸림돌이 있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컸다. 많은 구성원이 ‘도박이나 유흥 때문에 돈 빌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은 당사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었다. 취재팀은 우선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를 섭외하는 법은 단순무식했다. 우리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부터 금융 복지 관련 재단과 시민단체 등 총 52곳을 접촉했다. 취재 공문을 보내고, 기사의 취지를 몇 번이고 설명하면서 사방팔방으로 섭외를 부탁했다.
그중에는 한 온라인 카페도 있었다. 카페에서는 선주를 포함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이곳에 ‘제보를 기다린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인터뷰하겠다”는 답이 오기까지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소재를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결론은 피해자의 스토리텔링 기사는 빠질 수 없다는 것. 가해자 취재에 집중하더라도 우리 기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피해자였다. 다만 큰 걸림돌이 있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컸다. 많은 구성원이 ‘도박이나 유흥 때문에 돈 빌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은 당사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었다. 취재팀은 우선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를 섭외하는 법은 단순무식했다. 우리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부터 금융 복지 관련 재단과 시민단체 등 총 52곳을 접촉했다. 취재 공문을 보내고, 기사의 취지를 몇 번이고 설명하면서 사방팔방으로 섭외를 부탁했다.
그중에는 한 온라인 카페도 있었다. 카페에서는 선주를 포함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이곳에 ‘제보를 기다린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인터뷰하겠다”는 답이 오기까지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못한 이유
피해자들과의 통화는 기본이 1시간이었다. 질병, 실직, 교통사고…. 사채를 쓰게 된 배경은 바깥의 인상과는 달랐다. 더는 불법사채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럼 이제 할 일은 명확했다. 더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전화상으로 울분을 토하던 사람들이, 대면 인터뷰를 요청하면 난색을 보였다.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았다.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도중에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계속 전화할 순 없었다. 휴대폰을 못 쓸 정도로 전화해 대는 추심에 떨던 사람들이었다. 인터뷰 일정을 정하다가 갑작스레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결국 “다시 생각해보니 가정이 있어 나서기 힘들 것 같다”는 거절 문자를 받았다.
당황스러웠지만 이해가 갔다. 불법사채 피해자 기사에 어떤 댓글들이 달리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너 줄의 인용구가 아닌, 삶 전체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히어로콘텐츠팀 기사에 등장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취재팀이 할 수 있는 건 몇 번의 설득과 기다림. 그 뒤로는 오로지 피해자들에게 달려있었다. 문득 우리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빌어먹으며 지내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 결심을 후회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전화상으로 울분을 토하던 사람들이, 대면 인터뷰를 요청하면 난색을 보였다.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았다.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도중에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계속 전화할 순 없었다. 휴대폰을 못 쓸 정도로 전화해 대는 추심에 떨던 사람들이었다. 인터뷰 일정을 정하다가 갑작스레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결국 “다시 생각해보니 가정이 있어 나서기 힘들 것 같다”는 거절 문자를 받았다.
당황스러웠지만 이해가 갔다. 불법사채 피해자 기사에 어떤 댓글들이 달리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너 줄의 인용구가 아닌, 삶 전체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히어로콘텐츠팀 기사에 등장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취재팀이 할 수 있는 건 몇 번의 설득과 기다림. 그 뒤로는 오로지 피해자들에게 달려있었다. 문득 우리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빌어먹으며 지내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 결심을 후회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지금 선주는
선주와는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차례 만나고 통화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선주는 작은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건넸다. 직접 뜬 수세미였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였다. 헤어지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던 말이었다.
채무정리는 다름 아닌 온라인 카페 속 피해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대응법이라고 해봐야 다른 피해자들이 써준 경고 메시지를 업자들에게 보내고,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는 것이었다. 딸의 휴대폰은 바꾸었고, 고소장도 재차 접수했다. 평판이 무너진 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조용히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졌냐’ 물으면, 사실 곧바로 답할 순 없다. 기사를 보고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연락을 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선주의 첫 마디는 “혹시 업자는 아니겠지요?”였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추심에 여전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1회 보도가 나가고 “누가 사채 쓰라고 등 떠밀었냐” “자업자득이다”라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아주 틀린 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40만 원을 빌린 게 죄라면, 그 벌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어느 하루에 764통의 전화가 오는 건, “내가 니 딸 죽인다”는 말에 퍼뜩 잠에서 깨는 건. 40만 원의 대가라 부를 수 있을까. 정말로 잘 모르겠다.
채무정리는 다름 아닌 온라인 카페 속 피해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대응법이라고 해봐야 다른 피해자들이 써준 경고 메시지를 업자들에게 보내고,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는 것이었다. 딸의 휴대폰은 바꾸었고, 고소장도 재차 접수했다. 평판이 무너진 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조용히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졌냐’ 물으면, 사실 곧바로 답할 순 없다. 기사를 보고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연락을 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선주의 첫 마디는 “혹시 업자는 아니겠지요?”였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추심에 여전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1회 보도가 나가고 “누가 사채 쓰라고 등 떠밀었냐” “자업자득이다”라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아주 틀린 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40만 원을 빌린 게 죄라면, 그 벌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어느 하루에 764통의 전화가 오는 건, “내가 니 딸 죽인다”는 말에 퍼뜩 잠에서 깨는 건. 40만 원의 대가라 부를 수 있을까. 정말로 잘 모르겠다.
 6월 13일, 마지막으로 직접 만난 날 선주가 준 선물. 식빵 모양 수세미다.
6월 13일, 마지막으로 직접 만난 날 선주가 준 선물. 식빵 모양 수세미다.
관련 콘텐츠
더보기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벼랑 끝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불법사채.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과 피해자, 수사당국 관계자 등 157명을 취재해 '합법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불법사채의 세계를 추적했다.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과 피해자, 수사당국 관계자 등 157명을 취재해 '합법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불법사채의 세계를 추적했다.
2024.06.23~26·히어로콘텐츠 8기·

김태언 기자동아일보 사회부
사회·문화부 기자로 일하며 진솔한 인터뷰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여전히 진심에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Inside
더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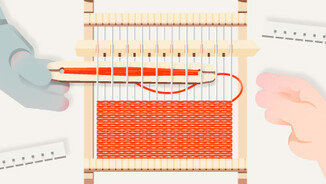
 생성형 AI 시대의 언론사와 디자이너 히어로 콘텐츠 11기의 주제는 '치매머니 사냥'이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흐릿해진 기억과 판단력을 노려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를 다룬 기획이다.취재 속 피해자 강대용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다. 하지만 치매가 찾아온 뒤 그의 …2026.01.13·정시은 UI/UX 디자이너
생성형 AI 시대의 언론사와 디자이너 히어로 콘텐츠 11기의 주제는 '치매머니 사냥'이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흐릿해진 기억과 판단력을 노려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를 다룬 기획이다.취재 속 피해자 강대용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다. 하지만 치매가 찾아온 뒤 그의 …2026.01.13·정시은 UI/UX 디자이너 -

 왜 ‘치매머니 사냥’이었냐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질 문제들. 처음 ‘치매 머니’를 아이템을 후보에 올린 건 그런 이…2026.01.12·이상환 기자
왜 ‘치매머니 사냥’이었냐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질 문제들. 처음 ‘치매 머니’를 아이템을 후보에 올린 건 그런 이…2026.01.12·이상환 기자 -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든다 취재가 끝났지만,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 목소리가 있다.‘치매머니 사냥’을 주제로 정하고, 취재에 착수한 지 석 달. 취재팀의 가장 큰 고민은 ‘주인공 찾기’였다. 소외된 이웃, 숨은 영웅을 다루는 히어로콘텐츠의 취지에 맞게 기사의 …2026.01.02·전혜진 기자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든다 취재가 끝났지만,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 목소리가 있다.‘치매머니 사냥’을 주제로 정하고, 취재에 착수한 지 석 달. 취재팀의 가장 큰 고민은 ‘주인공 찾기’였다. 소외된 이웃, 숨은 영웅을 다루는 히어로콘텐츠의 취지에 맞게 기사의 …2026.01.02·전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