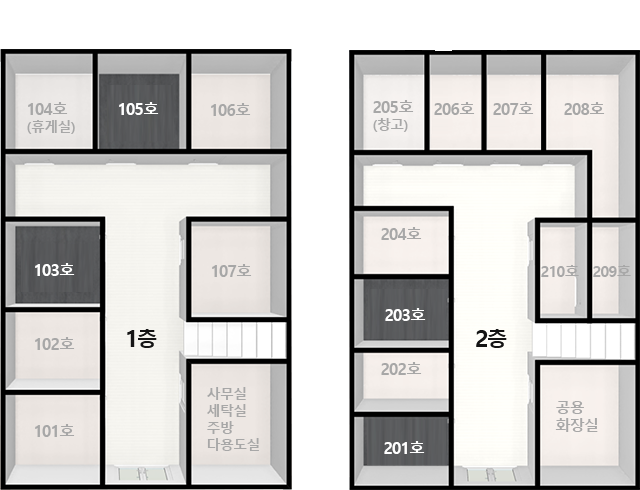구석 선반 위에 빳빳한 주민등록등본 한 부가 놓여 있다. 증발자와 등본이라니 어색한 조합이다. 황모 씨(65)가 등본을 손가락으로 쿡쿡 찍으며 말을 뱉는다. “이놈 이놈, 이것 봐. 옆에 아무도 안 적혀 있어. 아직도 결혼을 안 한 거지. 나이가 꽉 찼는데 말이야.”
황 씨는 17년 전 그가 알던,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을 버렸다. 이후로 그는 등본상으로만 부인과 아들을 만난다. 습관처럼 종종 등본을 떼어본다. 주소도, 가족 구성도 수 년째 그대로다.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자신의 터전에서 증발해버린, 혈혈단신인 지금의 자신이 더 견딜 만하다.
황 씨는 17년 전 그가 알던,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을 버렸다. 이후로 그는 등본상으로만 부인과 아들을 만난다. 습관처럼 종종 등본을 떼어본다. 주소도, 가족 구성도 수 년째 그대로다.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자신의 터전에서 증발해버린, 혈혈단신인 지금의 자신이 더 견딜 만하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한마디로 폼이 났다. 1975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의 대형은행에 들어갔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세무공무원이 됐다. 세무연수원 성적이 좋아서 그가 발령을 받기도 전에 ‘연수원 1등이 우리 지점에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잠시 시련이 있었다. 성과가 황 씨만 못한 후배가 먼저 승진을 했다. 일은 몰려도 ‘1등’이라는 자존심에 버티던 그는 조직에 쓴소리와 함께 사표를 던졌다. 안정적인 세무소를 떠나겠다고 하자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서울 성동구에 세무사무소를 차렸다. 직원은 10명으로 늘었고, 아파트와 차는 갈수록 커졌다. 아내가 여유롭게 백화점을 다닐 정도로 가족 모두 풍족한 삶을 누렸다.
모두가 곡소리를 내던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황 씨는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걸까? 너무 탄탄대로만 걸었던 걸까? 의외의 복병에 무너졌다.
부산에서 상경한 뒤 늘 고향 친구들 중에 제일 잘나가던 그는 ‘대장’ 같은 존재였다. 돈 좀 빌려달라는 친구, 투자를 해달라는 친구, 동업을 해보자는 친구 모두 황 씨가 거뒀다. 2000년대 초반, 이들이 줄줄이 악수(惡手)가 됐다. 대출까지 받아 거금을 투자한 친구의 말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간 친구도, 동업했던 친구도 빚을 갚아야 하는 순간 “미안하게 됐다”며 등을 돌렸다. 그간 황 씨의 씀씀이가 너무 컸던 탓일까. 카드 연체금이 밀렸고, 자금줄도 하나씩 막혔다.
모두가 곡소리를 내던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황 씨는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걸까? 너무 탄탄대로만 걸었던 걸까? 의외의 복병에 무너졌다.
부산에서 상경한 뒤 늘 고향 친구들 중에 제일 잘나가던 그는 ‘대장’ 같은 존재였다. 돈 좀 빌려달라는 친구, 투자를 해달라는 친구, 동업을 해보자는 친구 모두 황 씨가 거뒀다. 2000년대 초반, 이들이 줄줄이 악수(惡手)가 됐다. 대출까지 받아 거금을 투자한 친구의 말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간 친구도, 동업했던 친구도 빚을 갚아야 하는 순간 “미안하게 됐다”며 등을 돌렸다. 그간 황 씨의 씀씀이가 너무 컸던 탓일까. 카드 연체금이 밀렸고, 자금줄도 하나씩 막혔다.

삶은 180도 달라졌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서울의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외곽의 단칸방으로 옮겼다. 꾸역꾸역 버티던 세무사무소의 일감이 끊기면서 친구 술집에서 카운터 일을 맡았다. 마음 한편엔 ‘금세 재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며 자신의 자금줄, 아니 목숨줄을 조여 오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한테 정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줬더라면 하나씩 탁, 탁,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
친구들에 대한 원망, 직장 동료들에 대한 수치심,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뒤섞여 견딜 수가 없었다. 2003년 어느 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차올랐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몇 달만 나가 있겠다”며 출근하듯 집을 나섰다. 3개월만 도망치자 했던 것이 어느새 17년이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며 자신의 자금줄, 아니 목숨줄을 조여 오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한테 정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줬더라면 하나씩 탁, 탁,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
친구들에 대한 원망, 직장 동료들에 대한 수치심,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뒤섞여 견딜 수가 없었다. 2003년 어느 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차올랐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몇 달만 나가 있겠다”며 출근하듯 집을 나섰다. 3개월만 도망치자 했던 것이 어느새 17년이다.

영예스러운 지난날을 떠올리던 그는 대뜸 무협소설 속 한 구절을 인용했다.
“중국 무협소설 보면 갑자기 날 찾아오는 사람은 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40대까지만 해도 진짜 친구가 있었지. 그런데 쉰 살 넘으면 진짜 친구도 없어. 다 나를 등쳐먹고 배신하는 거지. 사람도 다 싫고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
사람도 세상도 싫다는 그는 어둠이 내리면 인근 다시서기센터(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로 나가 노숙인 도우미로 철야 근무를 한다. 어쩌면 아직 사람과 세상이 그리운 것일지 모른다.
“중국 무협소설 보면 갑자기 날 찾아오는 사람은 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40대까지만 해도 진짜 친구가 있었지. 그런데 쉰 살 넘으면 진짜 친구도 없어. 다 나를 등쳐먹고 배신하는 거지. 사람도 다 싫고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
사람도 세상도 싫다는 그는 어둠이 내리면 인근 다시서기센터(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로 나가 노숙인 도우미로 철야 근무를 한다. 어쩌면 아직 사람과 세상이 그리운 것일지 모른다.